아들의 테니스 그룹 레슨이 끝났다. 땀이 흐르고 숨소리가 거친 아들이 차 안으로 들어온다. 조금 있다가 아이는 차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요즘 아이돌 노래는 대체로 신나고 비트가 빠르다. 그런데, 음악이 나오자 아이가 대뜸 이렇게 말한다.
“아빠, 음악이 왜 이리 느려졌죠?”
2시간 동안 코트에서 아드레날린이 폭발했었나 보다. 평소에 듣던 음악이 느리게 느껴질 정도로……
누군가 세월을 두고 강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고 했다. 우리는 흐르는 강과 함께 둑에 난 길을 따라 아래로 걸어간다. 유년과 청년시절에는 걸음이 빨라서 강물이 자기보다 느리게 흐른다. 세월은 멈춘듯 하고 지루하기까지 하다. 지금 순간이 마치 앞으로도 영원할 것만 같다. 장년기가 되면 강물과 비슷한 속도로 걷게 된다. 잔잔한 강물을 보며 세월과 함께 익어간다. 노년기가 되면 강물이 흐르는 속도보다 더 느리게 걷는다. 강물은 세차고 세월은 말 그대로 유수 같이 달음질 치는 것 같다.
평소에 듣던 음악이 느리다고 느껴질 정도로 아이는 젊고 건강하고 싱싱하다. 부럽기도 하지만 은근히 흐뭇하기도 하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회상하던 어느 70대 지인이 생각난다. 중학교 때이던가, 담배를 몰래 피다가 아버지에게 들켰다고 한다. 당시 엄청나게 혼났다. 세월이 흐른 뒤 아버지는 그 때 사실 속으로는 마음이 흐뭇했다고 아들에게 고백했다고 한다. ‘네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 가는구나’ 하고 느껴지더라는 것이다. 그 전까지는 아직 그저 철없는 아이인줄로만 생각했단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은 내가 살이 조금이라도 더 찌면 금방 알아본다.
“요즘 마음이 편한가 보지?”
그러나 매일 얼굴 마주하고 사는 아내는 막상 내 실루엣의 변화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 자녀가 커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보통 때에는 늘 철없고 모자라고 돌봐야 할 아이로만 보인다. 그러다가 문득 아이가 갑자기 쑥 커 있는 것을 알아채고는 깜짝 놀란다. 그리고, 이제는 어쩌면 안심하고 삶을 좀 정리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에 가족들과 떨어져 사람들과 산장 같은 곳에서 작은 모임을 가졌다. 런던에서 멀리 떨어진 오렌지빌 외곽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다. 거기서 우리는 죽는 연습을 하였다. 죽어가는 사람에 관한 영화도 보고,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목록도 만들어 보고, 또 유언장도 작성했다. 왜 그런 버킷 리스트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각자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유언장을 발표하는 시간에는 여지 저기서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관 속에 들어가는 체험도 하였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죽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관 안에 누워서 들으니 묘한 감동이 흘렀다.
주변 정리를 하는 연습을 그렇게 우연히 하게 되었다. 막상 내 유언장에는 별 감동적인 내용이 없었다. ‘재산은 별로 없으니 적당히 나누어 가지고, 장기는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하고, 시신은 그냥 화장해서 적당한 나무 아래 뿌려주고, 일년에 한 번 정도 찾아와 기도 좀 해주고, 그 즈음에 나를 기념해서 미사에나 참석해라’ 정도였다.
그리고 ‘여보, 당신은 절대 재혼하지 마시오.’라는 말도 보탰다.
다른 분들과 참 대비되는 부분이었다. 많은 여자분들은 착하게도 ‘적당한 사람이 나타나면 나한테 미안해 하지 말고 재혼하세요.’ 라고 했다.
요즘 부쩍 강물이 빨리 흐른다고 느껴진다. 신호등이 격주로 발행되는데 2주가 너무 빨리 다가온다. 한달 한달도 금새 지나간다. 이번 여름은 좀 시원하다 싶더니 벌써 9월이 눈 앞이다. 간만에 갔다 온 여행에서 찍힌 내 사진을 보니 주름이 가관이다.
어릴 적 고향 근처에도 물이 흘렀다. 지리산 아래 산청에서 진주 남강으로 흐르는 작은 지류였다.
그런데 그 중간 어디쯤 개울 너머에 나병환자들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개울을 따라 나 있는 도로를 수없이 지나다니며 개울 너머 그 마을 입구를 무심코 바라보곤 했다. 누가 나를 그곳에 끌고 들어가지 않을까 괜스레 무서워하기도 했다. 얼마 전에 무슨 TV프로그램에서 그곳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다. 그곳이 ‘산청 성심원’이라는 곳임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한센병을 겪었으나 이제는 치유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스페인에서 젊은 시절 찾아온 유의배 신부라는 분이 30년 이상을 지키고 있었다. 30년. 젊을 때부터 먼 이국 땅에서 조용히 지내온 세월이었다. 그는 이런 저런 재주가 별로 없다며 카메라 앞에서 소박하게 웃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들과 같이 살아주는 것뿐이라 했다. 아무도 같이 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이라 했던가?
강물이 빨리 흘러가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조금 초조해진다.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에 몰입하다가 시간이 나면 TV 앞에서 빈둥거리기에 바쁜 것이 나의 인생이다. 일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어느 시점이 오면 좀 공허지지지 않을까? 누군가의 비를 같이 맞아줄 수 있는 일을 미리 좀 찾아 두어야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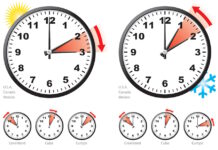





![자연도 자원도 완벽한 캐나다, 왜 경제발전은 더딜까? [캐나다 2부]](https://thelondonkoreannews.com/wp-content/uploads/2023/09/20230925-2-218x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