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턴 대학 뮤직홀에서 앙상블 연주를 감상했다. 어느 친절하신 분의 팁으로 딸과 함께 가게 되었다. 알고보니, 단과대학(Don Wright Faculty of Music) 인터넷 사이트에서 ‘event’를 모니터하면 일반인에게도 무료 감상의 기회가 심심찮게 제공되고 있었다. 음악에 문외한이어서 막상 무슨 곡이 연주되었는지도 가물하다. 아마 모짜르트의 곡에 현대적인 색채를 입힌 연주였던 것 같다. 덕분에 가을 저녁 한 시간을 고상하게(?) 보냈다.
내가 앉은 자리에서는 바이올린과 첼로의 틈으로 피아노 건반 위에 떠 있는 피아니스트의 하얀 두 손만 보였다. 조명을 받아서 그런지 유난히 빛나는 두 손은 격한 파도처럼 몰아치다가 때론 눈부신 나비처럼 나풀거렸다. 도무지 낭비를 모르는 절제된 손가락들, 오랜 숙련을 거친 장인의 손놀림이었다. 두 손을 둘러싼 주위 작은 공간에 어쩌면 저렇게도 완벽한 질서를 부여하는 것일까? 건반에 닿지 않고 허공에 있을 때조차 손가락 하나하나는 가장 적절한 비율로 발레리나처럼 공간을 누비고 있었다. 손과 손가락 사이 미세하고 단아한 근육들은 오로지 음악을 위해서만 특수하게 단련되어 있는 듯 했다. 연주를 듣는 내내 마치 공간이라는 화폭에 그림이 춤추듯 수놓아지는 모습을 보았다. 피아니스트는 런던에서 이미 어릴 때부터 유명했다고 들은 박 안젤라였다. 그 두 손은 천사의 페르소나처럼 보였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보통 사람에게는 잘 와 닿지 않는 말이 있다.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음악이 있다. 고로 신은 존재한다”라는 말이다. 아마도 감상의 재능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은데, 나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니 그 재능이 아쉽기만 하다. ‘신이여, 과연 이 작품을 내가 만들었단 말입니까?’할 때도 이와 비슷한 맥락일까? 잘은 모르지만 예술에는 언어가 전하지 못하는 신비한 면이 있는 듯하다.
성경의 시편에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창공은 그 손수 하신 일을 알려주도다.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도다. 그 말도 이야기도 비록 소리 없어도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 끝까지 번져가도다.’ 하늘과 창공, 낮과 밤에 새겨진 신비한 아름다움을 감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예술로 표현해 낸다면 신의 존재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인가 보다. 자연에 숨겨진 신비는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안고 있다.
고대 유태인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착하다(good)’라는 ‘도덕적’ 개념을 사용한 최초의 사람들이고, 이 점이 당시 모든 종교와 달랐다. 태초에 세상은 비어있었고 형태가 없었는데, 신이 하루 이틀 사흘 동안 형태를 부여하고 나흘 닷새 엿새 동안 그 안을 채웠다. 그리고 하루 하루 지날 때마다 작업 결과를 보고는 만족하며 ‘보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보기에 미적으로 ‘아름다웠다’라든가 공학기술적으로 ‘흠이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음…착하군(good)’하며 선악적인 판단을 했다고 하는 편이 더 옳을 것이다.
자연에 숨은 질서와 아름다움을 ‘착하다’라는 도적적 표현과 연결시킨 것은 놀라운 도약이다. 마치 우아하고 섹시한 몸을 보고 ‘착한 몸매’라고 하거나, 아주 정밀하고 마음에 드는 전자제품을 두고 ‘착한 기계’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말도 안되는 비약인 것 같지만 희한하게도 말이 된다. 유태인들은 신이 도덕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발견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구약성경에는 요즘 세상에 들으면 황당한 표현들이 등장한다. 우리는 종종, 뺨에 뽀드락지가 익어 터질라치면 ‘뽀드락지가 화가 났다’라고 하거나, 다쳐서 생긴 상처가 다음날 부어오르면 ‘상처가 화가 났다’라고도 한다. 뭔가 온전하고 건강한 상태에 흠이 생기거나 더러워지거나 상처가 심각해지면 ‘화가 난 것처럼’ 보이듯이, 옛 유태인들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문란해지거나 잘못을 저질러 민족의 건강 상태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경을 볼 때 ‘신이 노했다’라고 표현했다.
요즘에는 자연은 원인도 목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신이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되어버렸다. 백번 양보해서 신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냥 시계 만드는 장인이 시계를 만들어 놓았듯이, 신은 우주를 한번 만들어 째깍째깍 굴러가게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전혀 자연과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본다. 착하고 나쁘고 할 여지가 없다.
예전에 밤 하늘은 신이 자녀에게 덮어주는 담요 같은 것이었고, 거기에서 빛나는 별들은 어른들의 캠프 파이어에서 새어나오는 빛 같은 것이었으며, 우리는 그 빛에서 어른들이 나누는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음악처럼 들으며 잠들었다. 이제 하늘은 그저 ‘침묵하는 우주’, 그래서 무섭고 어두운 공간이 되어버렸다.
보이는 것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한치의 낭비 없이 절제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질서있게 공간을 가르는 한 피아니스트의 ‘보이는 손놀림’을 통해, 시간을 질서있고 아름답게 수놓는 ‘보이지 않는 음악’을 본다. 보이는 내 몸이 행하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 내 몸을 질서있고 우아하게 행위함으로써 내 인생을 좋은 음악으로 연주할 수 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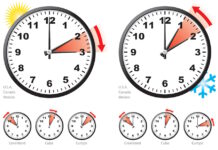





![자연도 자원도 완벽한 캐나다, 왜 경제발전은 더딜까? [캐나다 2부]](https://thelondonkoreannews.com/wp-content/uploads/2023/09/20230925-2-218x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