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가 따스하다. 2월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러다 정말 봄이 오지 싶다. 무거운 몸과 들뜨는 마음으로 길을 나섰다. 북쪽 서닝데일을 향해 아델레이드 길을 운전하고 있었다. 순간 움찔했다. 얼핏 옆눈으로 갈색 비닐봉지 같은 것이 반대편에서 차 옆쪽으로 갑자기 날아오는 것이었다. 옆문에 부딪혔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이상했다. 백미러로 살피니 그제서야 부딪힌 것은 비닐봉지가 아니라 아스팔트를 가로질러 질주하던 다람쥐였다는 것을 알았다. 본의 아니게 한 생명을 앗아간 사고였다. 다람쥐는 도로 중앙선에 누워 있었다.
좋게 시작했던 하루에 금이 간다. 시간에 생채기를 낼 만큼 날카롭고 아픈 것은 아니었지만 따스한 봄날의 하루에 한줄기 그늘진 자국을 드리웠다. 시간에 난 자국인지 마음에 들어선 얼룩인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자가 반갑지 않다. 그러나 스쳐가는 바람결처럼 교차로를 돌자마자 벌써 대수롭지 않은 듯 기억에서 멀어져 갔다. 문득 내 딱딱한 감수성이 낯설게 느껴진다.
어릴 때 산속에서 새총으로 새를 사냥하기도 했었고 꿩이나 노루를 잡으려고 한적한 곳에 덫을 놓기도 했었지만 실제로 잡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 빨간 피가 흐르는 짐승을 죽인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그렇다고 생명을 훼손한 적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어린 시절의 놀이는 잔인하기만 하였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거름을 뒤져 지렁이를 잡은 다음 토막을 내기도 했고, 논두렁 개구리를 장난으로 패대기 치거나 메뚜기 다리를 분지르거나 잠자리 꼬리를 잘라 멀리 날아가지 못하게 불구를 만들었다. 그러나 빨간 피를 흘리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죄책감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옳지 않음’을 느낀다.
신은 자연을 축복했었다. 창세기에 보면 ‘없는 것이 여러모로 자연스럽고 당연한데도’ 신은 굳이 만물을 창조하여 ‘있게’ 만든다. 생명의 터전을 만들고 그 안에 생명을 채우며 ‘보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한다. 마지막 날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창조함으로써 모든 절정을 이루는데 ‘참’ 좋았다’라는 표현으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다.
자연에 대한 애정은 7일째에 절정을 이룬다. 7은 히브리어로 shevah(일곱)인데 안식일(shabbat)의 어원이 되고 ‘맹세한다(oath)’라는 뜻을 가진다. 맹세는 고대사회에서 혼인 등과 같은 ‘계약’을 맺을 때 등장하는 말이다. 즉 신은 엿세 동안의 노동이 피곤해서 쉰 것이 아니라 그날 우주만물과 사랑의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것이 신화라면 아름다운 신화이고 사실이라면 더욱 감동적인 일이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날을 마치 결혼기념일처럼 매주 기념해왔다.
다람쥐가 나로 인해 피를 흘렸는데도 왜 죄책감이 없는 것일까? 신에게 미안하다. 우주만물은 신의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 아니던가? 그러나 나는 다람쥐 한마리 죽은 것쯤은 캐나다 도로에서 통계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일로 치부해버린다. 생명의 고통에 왜 이다지도 무심할까? 애정결핍이다. 차라리 집 잔디 마르는 것이 더 안타깝고 측은하다.
집에는 기르고 있는 강아지가 있다. 이 조그마한 녀석에게서 애정을 수혈 받고 있다. 자라면서 꼭 필요한 시점에 정확한 타이밍으로 충분한 애정을 받고 자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 부족한 일부분을 강아지로부터 채운다. 시간이 갈수록 빠져든다. 산책을 시키는 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고단하지 않다. 눈이나 비, 폭풍이 몰아쳐도 아침에 산책을 간다. 씻기는 일도 그다지 귀찮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꼬리치며 달려가는 것을 보아도 시샘이 나지 않는다. 주인을 배신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유쾌한 본성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정을 준 만큼 따르고 정성을 들인 만큼 귀엽다. 애정결핍으로 꼬여있는 마음을 이 강아지가 조금씩 풀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마음이 점점 말랑말랑해져서 이름 모르게 죽은 저 다람쥐에게도 ‘옳지 않음’만이 아니라 측은지심도 드는 날이 오면 좋겠다.
다음날 그 길을 지나니 다람쥐는 치워져 있었다. 봄은 오고 있은 데도 마음은 어찌 이리 차가운지 포근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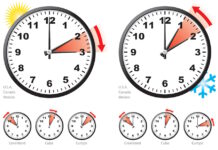





![자연도 자원도 완벽한 캐나다, 왜 경제발전은 더딜까? [캐나다 2부]](https://thelondonkoreannews.com/wp-content/uploads/2023/09/20230925-2-218x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