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물게 화창한 하루였다. 선선한 날씨는 얇은 긴팔 옷으로도 충분 할 정도로 상쾌했다. 나무들은파란 가을 하늘이 뿜어내는 햇빛을 받아 울긋불긋하게 응답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너머 서쪽 저녁 하늘은 더욱 더 남색으로 짙어졌고, 구름은 노을로 여기저기 노랗게 물들었다. 이다지도 좋은 계절에 나는 태어났다.
둘째 아이와 채팅을 하시던 장인어른께서 전화를 하셨다. 오늘이 내 생일이라는 것을 둘째를 통해 아시게 되었나 보다. 얼마 전에 다녀 갔을 때 오늘이 생일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 주지 그랬냐며 서운해 하셨다. 음력으로 생일을 지내는 통에 나도 내 생일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말씀 드리니 금방 이해하셨다. 장인께서도 나와 마찬가지로 음력으로 생신을 지내고 계셨던 것이다. 모두가 기억하기 좋도록, 태어난 날의 양력 생일로 바꾸어 보려고도 했으나 영 낯설어서 흐지부지 음력으로 계속 지내게 되었다. 그래서 내 생일은 아이들에게 베일에 싸여 있고 심지어 나조차도 아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기 일쑤이다.
둘째 형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감지한 우리 부모는 자식을 하나 더 갖기로 결심하고 좀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막둥이로 나를 가질 결심을 했다. 아무래도 당시에는 자식이 두 명 밖에 되지 않으면 좀 모자란 듯 하였기 때문이다. 뜻밖에 생긴 것이 아니라 부모가 계획을 하고 낳아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이지만, 형님과 생사가 엇갈리는 지점에서 태어난 탓에 결국에는 돌아가신 형에 대한 미안함이 늘 가슴 한 켠에 자리하게 되었다. 임신하였다고 해서 열외시켜주지 않는 농촌환경에서 어머니는 5개월된 나를 뱃속에 안고 모내기를 했어야 했고 나를 낳을 무렵에는 가을 추수가 한창이었다. 이다지도 좋은 가을 햇빛을 내가 무작정 즐길 수만은 없는 이유이다.
‘오캄의 면도날’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것이 진리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취지이다. 그래서 단순함에 이르기 위하여 복잡한 것은 면도날로 쳐내고자 하는 태도를 지닌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을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내가 태어난 경위만 보더라도 슬픔과 기쁨, 고통과 축복이 뒤섞여 있다. 자연은 공식과 법칙이 지배하지만 사람이 사는 세계는 마치 ‘역설’이 오히려 진리의 근간인 것처럼 보인다.
박목월은 ‘술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속으로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를 노래했다. (술익는 마을)의 아름다움(노을)은 늘 죽음(저녁 서쪽 하늘)을 배경으로 연꽃처럼 피어난다. 그리고 우리는 ‘삼백리 외길’을 걸으며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윤동주는 그런 나그네 길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고자 했다. 삶과 죽음, 고독과 사랑, 시련과 아름다움이 이들의 시에도 뒤섞여 있다.
‘모순’의 경우에는 진리를 위해서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사라져 주어야 한다. 그러나 역설의 경우에는 불편하더라도 진리를 위해서는 둘 다 다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하는 듯 보인다. 사람처럼 역설적인 존재가 없다. 존재(being)와 무(nothing)가 섞여있고 삶 속에 죽음이 숨어 있으며 근원이 다른 영(spirit)과 육(body)이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영이 있지만 천사처럼 순수한 영적 존재도 아니고,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도저히 물질로 환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불편하다고 하여 한쪽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영지주의(Gnosticism)로 빠지거나 유물론으로 길을 잃게 된다. 사람의 영혼은 오직 육체를 통해 더 알고 더 사랑하며 계속 성장해야만 온전하도록 지어졌다.
내 생명은 일찍 죽은 형에게, 그리고 나를 낳기 위해 고생하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에게, 그리고 자라면서는 나를 참아주신 아버지에게 심한 빚을 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내가 존재하도록 최초의 원인이 되는 미지의 존재에 대하여도 빚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그 빚들을 다 갚을 수 있는지 헤아릴 길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갚을라치면 당사자들에게 직접 갚을 길이 없는 이상, 그 빚갚음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로 향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윤동주는 그래서 ‘별을 헤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하며 결심했을 것이다.
빚이 없다고 여기는 것보다 빚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 더 큰 축복임을 어렴풋하게나마 느낀다. 축복 받은 자는 세상에 갚아야 할 빚이 있다. 그래서 축복과 빚은 늘 함께한다. 사랑받은 자가 감당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역설이다. 교만과 독선과 위선이라는 바람이 별을 스치우는 외로운 밤에도 윤동주처럼 죽어가는 것을 과연 사랑할 수 있을지 나는 두려울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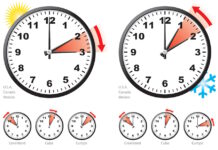





![자연도 자원도 완벽한 캐나다, 왜 경제발전은 더딜까? [캐나다 2부]](https://thelondonkoreannews.com/wp-content/uploads/2023/09/20230925-2-218x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