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풀리니 곧 바비큐 시즌이다. 기다리던 무쇠(cast iron) 후라이팬이 드디어 도착했다. 인근에서는 마땅한 것이 없어서 아마존에서 25불짜리를 주문했었다. 숯불을 준비하거나 그릴을 청소하는 일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 식구가 모인 특별한 자리가 아닌 바에야 여간해서는 불을 피우지 않게 된다. 프로판 가스를 사용하는 바비큐 그릴도 청소가 고역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삼겹살이든 스테이크든 숯불을 피지 않고도 버금가는 맛을 낼 수 있으면서 좀 간편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무쇠 후라이팬을 탐하게 되었다. 녹이 슬지 않도록 물기를 말려 보관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감수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았다.
코스코에서 스테이크를 사다가 간을 한 후에 시험 삼아 구워보았다. 고기 표면의 물기를 닦아내지 않고 구워버리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얼마만큼 속이 익었는지 몰라 당황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러웠다. 식구들도 (사춘기에 들어선 막내를 제외하고는) 마음에 들어 했다. 굽는 마지막 단계에서 향을 내는 이파리나(thyme), 버터, 혹은 아들 덕분에 알게 된 ‘발사믹 식초’ 등을 넣어 주니 숯불에 뒤지는 맛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다. 자주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생겼다.
음식을 굳이 해야 한다면 최대한 덜 귀찮은 방식으로, 정성보다는 편리함에 의존하여, 영양섭취보다는 한 끼 때우는 데에 치중하는 편이다. 그렇지만 대체로 나는 식탐이 많은 사람 같다. 식구들이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늘 조금씩 남는 부분은 늘 내 차지였었다. 요즘은 가끔 아내와도, 막내와도 경쟁하게 된다. 그러면서 다 같이 체중이 늘어만 간다. 사춘기 막내는 내심 불안한지 그 싫어하던 운동을 시작했다. 엄마랑 산책을 자주 하는가 하면 집에서는 윗몸 일으키기를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극구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라고 우긴다.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혹시라도 마음 깊숙한 나만의 불안과 공포를 대면하기가 두려운 탓에 그것을 외면하는 방법으로 대신 음식이 주는 손쉬운 맛을 과도하게 향유하는 버릇이 있다면 이것은 의외로 심각한 문제이다. 탐식(gluttony)이 해로운 이유는 내가 음식과 맺는 관계가 부적절하고 뒤틀렸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에 죄스럽게 생각하던 것들이 자연스러운 욕망의 표출로 보는 경향이 있다. 탐식 역시 글자 순서만 바꾸어 ‘식탐’이라는 말로 순화해서 사용한다. 죄스러움을 빼고 그냥 좀 귀여운 습관 정도로만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탐식이 진정 죄스러운 이유는, 고요하고 어두운 방에서 홀로 스스로의 진정한 모습과 대면할 때 느끼는 부담과 불안과 공포에서 빨리 도망가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체 모를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푸는 것이다.
그 정체 모를 스트레스는 유년기에 경험한 어떤 ‘한’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시골에서 자란 나는 음식에 대한 즐거운 기억 보다는 도시락 반찬에 대한 창피한 기억이 더 많다. 양은 도시락에서 번져 나온 김치국물은 늘 교과서의 귀퉁이를 물들이곤 했고,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둘러 앉은 책상에서는 도시락을 꺼내기가 늘 민망했었다. 그 와중에 친구들은 구김살 없는 미소를 띠며 계란 옷 입은 햄과 구운 소시지 반찬을 꺼내곤 했다. 서울에 올라와서 허리우드 극장 근처에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과 피자헛의 피자를 먹었을 때는 봉사가 눈을 뜬 것처럼 참으로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다. 나의 식탐은 이런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에 생겼는지도 모를 일이다. 음식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다.
불교의 탱화 중에는 ‘아귀(굶어죽은 귀신)’가 있는데 그 생김새가 독특하면서도 흉측하다. 대체로 입이 무지 크고 이빨은 송곳처럼 삐쭉삐쭉 솟아있다. 아귀찜이 되는 물고기의 입을 보면 왜 아귀라고 이름 붙였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아귀의 목은 놀랍게도 실처럼 가늘다. 또, 손톱과 발톱은 짐승의 발톱처럼 날카롭고, 온 몸은 말라있는데 오직 배만 뽈록하게 나와있다. 이놈이 바로 음식에 한을 품고 죽은 귀신이다. 뭔가에 한이 있는 사람은 내 곳간은 넘쳐도 그것을 잊은 채 남의 집에 가서 거지처럼 동냥하러 다닌다고 한다. 아귀는 배가 이미 불렀는데도 그 크고 무서운 입과 손발톱으로 삼키지도 못할 음식을 탐한다. 그러나 몸 전체가 말라붙었듯이 그 삶 또한 메마른 모습이다.
아귀에게는 오직 음식만이 보인다. 내 안에 무슨 한이 있는지 실마리를 알려면 내 눈에 자주 띄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된다. 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곳에 눈이 머무르기 때문이다. 아귀에게는 음식만 눈에 띄는 것과 같다. 길가다가 집이나 자동차를 유심히 보게 되거나 남의 집 세간살이에 자꾸 눈이 간다면, 혹은 남의 직업이나 성공 스토리가 자꾸 마음에 생생하게 떠다닌다면, 혹은 걸어가는 여인의 자태가 자꾸 눈에 들어온다면, 혹은 어떤 사람의 교만한 모습이 자꾸 관찰된다든지, 누군가의 허영이 쉽게 포착된다든지 한다면, 한번쯤 내 마음 속을 들여다볼 일이다. 그것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똑 같은 것이 숨어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직 선수만이 선수를 알아보는 법이다. 어쩌면, 과거에 죽도록 가지고자 했으나 가지지 못한 것, 혹은 잃을까 죽도록 두려워했으나 결국 잃게 된 무엇이 기억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한이 되기 때문이다.
아귀가 음식에 집착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두려움 때문이다. 이것을 가지지 못하면 죽을까봐, 혹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으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두려움은 사랑과 함께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두 가지 감정이라고 했다. 사랑이 미움을 낳듯이 두려움은 분노를 낳는다. 우리 마음의 모든 평화롭지 못한 근간에는 어쩌면 애정의 결핍이나 왜곡된 공포의 경험이 있지 않을까? 자라를 보고 놀랐다든가…
후라이팬을 장만해서 코팅까지 하는 열성을 보이는 내 모습에 흠칫해서, 내 속에 혹시 음식 말고도 다른 어떤 한이 서려있는 것은 아닌지, 그 상처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 뭔가를 아귀처럼 탐하고나 있는 것은 아닌지 괜스레 돌아보게 되는 하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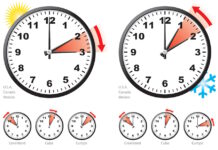





![자연도 자원도 완벽한 캐나다, 왜 경제발전은 더딜까? [캐나다 2부]](https://thelondonkoreannews.com/wp-content/uploads/2023/09/20230925-2-218x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