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점에서 미리 사다 놓은 노란 단무지를 냉장고에서 꺼내 사각형으로 길게 썰었다. 계란을 풀고 흰 소금을 약간 섞은 다음 젓가락으로 한참이나 휘저어서 후라이판에 부쳤다. 옅은 갈색으로 잘 익었을 때 역시 길게 썰어냈다. 또 캔에서 꺼낸 참치 살을 쥐어 짠 다음 마요네즈를 섞었다. 밥솥에서는 하얀 밥을 떠서 소금과 참기름을 조금 섞은 후에 짙은 김 위에다 얇게 펼쳤다. 그 위에 계란과 단무지와 참치를 올리고 힘차게 말았다. 김밥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전에는 감히 엄두도 못내던 일이었다. 조촐한 내용물에 비해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잘 썰어서 아이들 점심 도시락으로 가방에 넣었다.
김밥 도시락이 잘 어울리는(?) 그런 늦가을 아침이다. 오랜만에 맑은 날씨였다. 파란 하늘에 실구름이 드문드문 스친다. 막내를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나왔다. 차는 밤 사이 내린 이슬로 뒤덮여 햇빛을 머금은 채 반짝이고 있었다. 나무 아래 세워둔 탓인지 젖은 낙엽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차에 들어서니 아이가 타는 조수석 창문에 ‘아빠는 멍청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다. 타기 직전에 아이가 이슬맺힌 창문 위에다 뭔가 끄적이더니 저 말을 거꾸로 새겨놓았던 것이다. 그 영특함이 내심 대견했지만, ‘너도 마른 귤껍질처럼 생겼어’하고 맞받아 주었다.
거리는 아직도 풍성한 단풍들을 머금고 있었다. 빨갛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고 주황색도 연두색도 보인다. 파한 하늘 아래 단풍들의 잔치라도 벌어진 것 같다. 밤사이 바람이 불었는지 길은 온통 낙엽으로 가득한데 떨어진 낙엽마저도 찬연하다. 놀란 토끼가 가벼운 몸놀림으로 도망치는 잔디밭은 서리인듯 이슬로 덮였는데, 햇빛이 반사되니 눈부시게 빛나는 보석이 된다. 무지개 속 세상이 존재한다면 이럴까? 오색의 향연이 펼쳐졌다. 굳이 먼 길을 돌아 단풍 구경을 가지 않아도 집 근처에서 이런 구경을 하다니 이 무슨 호사인가 싶다. 10월에 태어난 나로서는 본능적으로 애착이 가는 풍경이다.
이 계절은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다. 이맘 때쯤 새벽녘에 비가 갑자기 지나갈 때면 한쪽은 걷히고 한쪽은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진한 무지개를 만나기도 한다. 저녁 무렵에는 옥빛 하늘에 숨막힐듯 아름답게 수놓인 노을을 마주치기도 한다. 특히 Niagara on the lake 주변 넓은 포도밭 평지에서 하늘 가득 펼쳐진 노을이라도 접하는 날이면 그 장면은 평생 잊지 못하고 마음에 간직하게된다.
어떤 이는, 마치 어느날 운동장에 떨어져 있던 키보드에 우박이 떨어져 희한한 확률로 어떤 프로그램이 씌어졌고 그 프로그램으로 기계가 어찌저찌 돌아가듯, 우리 세상은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져서 목적없이 진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오늘 아침과 같은 시간을 거닐다 보면 본능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첫 아이를 낳아 바로 품에 안았을 때 산모가 체험하는 신비로운 감정도 이와 비슷하다고 들었다. 여성들이 더 종교적인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찬란한 색깔의 잔치도 대부분 10월 말을 고비로 사라지고 만다. ‘시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이용의 노래가사가 아쉬움과 섭섭함을 담아 마음에 우수를 남기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11월, 잔치는 끝났다.’ 11월이 되면 그렇게 화려하던 단풍들이 비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하늘은 점점 회색빛으로 변해간다. ‘색즉시공’이라는 말은 변화를 염두한 말도, 허무를 표현하는 말도 아닐테지만, 자연스레 마음은 차분해지고 결국 공허해진다.
시월의 마지막 밤은 모든 잡귀들의 밤인 할로윈이다. 최후의 발악과도 같은 것일까? 그 혼란의 밤이 지나면 죽은 자들의 시기인 11월이다. 특히 우리는 의로운 죽음을 맞이한 성인들, 혹은 단순히 우주의 먼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가지고 잠들어 있을 앞서간 영혼들을 생각하게 된다. 묘지를 지날 때면, 죽은 이들이 내 기도를 들을 수 있을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먼저간 가족들에게 자비가 주어지기를 간구한다.
그러나 아직은 10월이다. 찬연한 아침을 지나며, 금새 사라져버리는 이런 소소한 감동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잠시 생각한다. 어느날 죽음이 찾아와 모든 것이 날숨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면 이러한 작은 감동에 젖어드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어쩌면 어떤 악마적인 존재에게 조롱당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를 즐기라’느니, ‘물방울이 바다에 흡수되듯’이라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맛보는 미소한 감동들은 어쩌면 차후에 찾아올 더 큰 감동에 ‘간을 미리 보는 것’과 같은 메세지를 던지는 것은 아닐까? 알 수 없다. 기왕이면 후자이기를 바랄 뿐이다.
누구나 행복해지려 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 볼 때 진실로 행복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만약 그런 행복이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라면 사람의 실존은 그야말로 비참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마치 소화기관은 가지고 태어났지만 음식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영원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사는 것과 같다.
계절이 주는 깜짝 선물로 이 아침 조금이라도 내가 행복했다면 이런 경험으로 인해 어쩌면 더 큰 행복에 대한 갈증도 역시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가 아니면 저 세상에서라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지금은 속으로 탄식하고 있을지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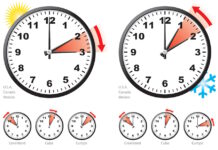





![자연도 자원도 완벽한 캐나다, 왜 경제발전은 더딜까? [캐나다 2부]](https://thelondonkoreannews.com/wp-content/uploads/2023/09/20230925-2-218x150.jpg)





